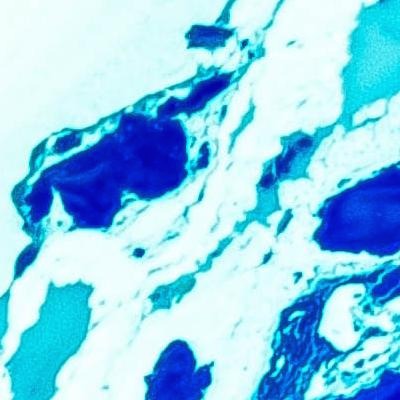티스토리 뷰
무덥고 끈적거리는 여름이 찾아온 데에는 별 이유가 없었다. 벌레가 자연스럽게 꼬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전에도 꽤 많은 여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유난 떨 것 없이 담담했다. 한낮의 햇줄기처럼 따가운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어디에나 자갈처럼 얇게 깔린 수군거림을 밟아내며 딱히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되는대로 울어버리지도 않았다. 여름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다만 그들은 이 여름이 마냥 즐거운 모양이라, 이유라든가 하는 것에는 통 관심이 없었다.
아마 내가 자꾸만 무뎌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목을 죄려 그들은 습도를 높인 것이리라. 그리고 초여름에는 나도 내가 여기저기 갈린 탓에 무감해지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점점 날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숨 한 번 쉴 때마다 깎여나가면서 그럴수록 구석진 곳으로 파고들어가 너덜너덜, 헐거워진 눈꺼풀을 애써 닫았을 뿐이라는 걸, 너의 여름을 목격하고 나서 깨달았다. 너 역시 둥글게 뭉치는 땀을 훔쳐내며 발을 굴려 천천히, 돌아서고 있었음을 두 눈에 담고 나서야, 그제야 밖으로 흘러넘쳐 뭉개지는 나를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섬짓 놀라 얼른 그것들을 주워담으려 했지만 눈길이 자꾸 너에게로 돌아가는 바람에 헛손질만 했다.
교실 뒤편에는 거울이 있었다. 모두 밖으로 나가고 없을 때 그 안을 들여다 보았다. 타인을 마주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작아진 두 눈이 가느다랗게 흐르는 단발머리에 가닿았다. 다 그랬다. 목덜미, 어깨, 팔, 무릎, 모두 가느다랬다. 그래도, 그래도 여름 한 계절 버티기엔 충분히 단단할 거라고, 입술을 물고 생각하던 중 교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린 순간 부서질 듯 떨리는 그것들을 목격했다.
쟤 뭐 하냐. 너 뭐해, 거울 봐? 왜, 이새끼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어이없다는 듯 지분대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옆에 있던 너를 툭 치며 갑자기 웃었다. 역한 냄새가 확 풍겼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무의식의 신호를 인지하면서도 거울을 통해 너를 흘긋 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그저 지나가듯 중얼거린다. 걱정 마라, 트럭으로 갖다바쳐도 안 받아.
토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한 번 실소를 터뜨리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렴 그 누가 감히 계절을 거스르는가.
그 후 여름은 짙어질대로 짙어졌고, 그때의 그 웃음을 시작으로 나는 마음 놓고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어린애가 플라스틱 블록으로 쌓은 장난감 성보다도 허술했다. 나는 더이상 숨지 않고 붕괴하는 나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흥분하여 한여름을 즐겼다. 허옇게 타는 햇빛으로 점점 아득하게 가려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때의 악취를 생각했다. 아직도 코끝에 남은 그 향을 온몸으로 곱씹으며, 뭔가의 결의가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를 생각했다. 향을 되짚었다.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서 너를 그리고 악취를 떠올렸다. 선명해지고, 확고해지고, 마침내 나를 지배하게 된 그것은 속삭였다. 무섭도록 속삭였다.
너를 돌릴 테다. 너는 두 눈이 멀도록 작렬하는 태양을 보게 될 테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공명하는 여름이 막바지로 접어든다. 이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다. 사람의 얼굴이 원래 저렇게 포말처럼 이지러지는 것이었던가. 음악이란 원래 이렇게 시끄러운 비명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을까. 원래 길은 울렁여 자꾸만 발이 빠지게 하고, 공기는 너무 커서 들이마실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이었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 어느샌가 내 눈이 비뚤어져 박힌 탓인가. 구타의 감각만이 이토록 뚜렷한 이유가 뭘까. 반짝인다. 폭죽처럼. 교실을 구르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연소하는 것 같다가도 원래대로.
그렇게 흐르던 나는 어느덧, 어떤 계단 앞에 멈추어진다. 계단은 위를 향하고 있다. 나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한 걸음씩 내딛는다. 그러자 주변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나는 이곳이 여전히 학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딘가에서 막연한 소음이 들려오기에 뭔지는 몰라도 어떤 수업이 막 끝난 참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찾겠지, 아직도. 그 지독한 태양 아래 서있는 그들이 날 찾겠지. 하지만 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오래 전부터 내 안에 속삭이고 사무치던 결의를 비로소 두 손으로 옮기려 하니까.
목적지에 다다른 나는 어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 고개를 끄덕인다. 이곳을 향해 시뻘겋게 번져오는 저 노을은, 분명 가을의 시작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빛나는 가을이 옥상 난간을 붉게 적시고 있다. 가는 머리카락이 약한 바람에 날리고, 나는 두 손으로 붉은 난간을 감싸쥔다. 여름은, 마침내 끝이 난다. 해가 죽으면서 드디어 이 가을에 부서질 것이다. 너의 열대도 녹아 없어질까. 너와 나의 시작은 그 온도가 기억도 안 나는 겨울이었음을 마지막으로 떠올려본다. 그때는 아마 눈이 새하얗게 덮여서 서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그걸로도 충분했던 겨울이었다.
이 세상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으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내가 흘리는 피로 단풍 들 가을을 부디 즐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