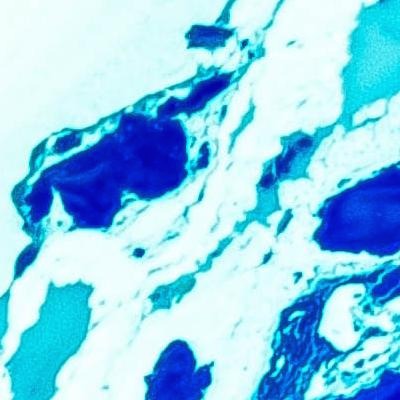티스토리 뷰
초여름의 따뜻한 공기가 가득한 비좁은 교실 안, 시야를 가로막은 하얀 벽과 그 위의 초록 칠판. 선생이 그 위에 공들여 적는 하얀 글씨 중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들의 침묵 위로 독재하듯 흐르는 설명 역시 그랬다. 단정한 검정의 머리들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우개 가루처럼 뭉쳐 회백색 지루함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나는 별 망설임 없이 아무도 듣지 못 할 만큼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창 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늘이 유난히 새파랬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주 작은 변화도 찾을 수 없는 심심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런 심심한 풍경을 비추는 유리 위로 투명하게 그려진 형체가 문득 보였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 홀로 속삭이는 바람처럼, 우아하게 이어지는 턱선 위로 퍽 무신경하게 다물린 입술. 유리에 반사된 네 옆얼굴이었다. 코끝은 공기가 드나들기는 하는지 고요하고 어쩐지 날이 선 느낌에 유리를 적신 하늘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눈이 정면을 응시하다 곧 내리깔린다. 속눈썹 아래 반쯤 숨은 눈동자가 문득 굴러 이쪽을 향했다. 나는 흠칫, 숨을 멈추면서도 네가 있는 유리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눈빛이 묘했던 거지. 마치 차갑고 하얀 손가락에 눌린 피아노 건반의 화음처럼 섬세하게 나를 지배했다. 그리하여 나는 당장이라도 이 갑갑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네 뺨을 건드리고 싶었다. 네 눈동자는 곧 아예 곱게 감기는 눈꺼풀 아래에 가려져 버린다. 그게 조금 야하다는 생각마저 들어 나도 모르게 입술 안쪽 살을 물었다. 침이 고이는데 삼키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상하게도 너를 담은 유리창은 나를 묶어놓고 자꾸만 천천히 파랗게, 쏟아진다.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결에게 (0) | 2017.11.22 |
|---|---|
| . (0) | 2016.11.09 |
| 한 여름 밤의 낙타 (0) | 2016.08.20 |
| 적막한 집 안에서 (0) | 2016.08.02 |
| 새파란 바다에 세일러 칼라 (0) | 2016.08.02 |